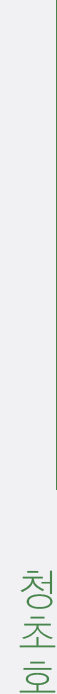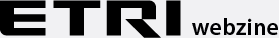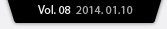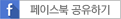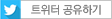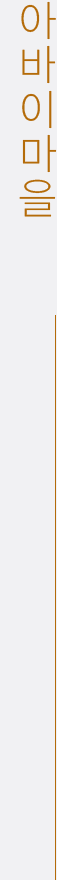
그리움이 만든 작은 항구도시 아바이마을
행정구역상 청호동으로 불리는 아바이마을은 한국전쟁 이후 남쪽으로 피난 온 사람들에 의해 형성된 어촌마을이다. 그들은 단지 고향 땅과 가깝다는 이유로 이름도 없는 작은 포구에 집을 짓고 집단촌락을 형성했다. 처음에 그들은 부서진 배 조각과 미군부대 쓰레기장에서 나온 레이션박스로 움막을 지어 피난살이를 시작했다. 그리고 점차 움막이 흙집으로, 시멘트벽과 슬레이트 지붕의 양옥집으로 변해가며 아바이마을의 모습도 조금씩 변해 왔다. 그렇지만 아바이마을의 현재는 그 세월을 그대로 간직한 듯 길은 여전히 좁고, 붉고 푸른 지붕의 집들은 한 결 같이 낮았다.
‘아바이’란 말은 함경남도와 평안남도 일대에서 아버지나 할아버지를 뜻하는 말이다. 나이든 사람이 많았기에 마을은 ‘아바이, 아바이’하는 소리로 가득했고 그래서 아바이마을로 불리기 시작했다.
그들의 삶은 고단했다. 급히 피난 온 터라 갖은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었다. 그럼에도 그들은 고향 갈 날만을 기다렸다. 남자는 고깃배를 타고 나가 생선을 잡았고, 아낙네들은 돌아온 고깃배 그물에서 생선들을 떼어내며 어려운 시절을 이겨냈다.
그러나 지금의 아바이마을은 텔레비전 드라마와 오락프로 촬영지로 유명세를 타면서 관광지로 변모해 있었다. 실향민들의 참모습은 오징어순대 등의 먹거리나 온갖 유명인이 다녀갔다는 간판 뒤에 가려져 있었다. 하지만 청호동 주민들과 관광객들을 건네주는 나룻배와 함경도의 북녘의 맛과 푸근한 인심을 간직한 아바이순대가 실향민들의 삶을 느끼게 해주고 있다.
행정구역상 청호동으로 불리는 아바이마을은 한국전쟁 이후 남쪽으로 피난 온 사람들에 의해 형성된 어촌마을이다. 그들은 단지 고향 땅과 가깝다는 이유로 이름도 없는 작은 포구에 집을 짓고 집단촌락을 형성했다. 처음에 그들은 부서진 배 조각과 미군부대 쓰레기장에서 나온 레이션박스로 움막을 지어 피난살이를 시작했다. 그리고 점차 움막이 흙집으로, 시멘트벽과 슬레이트 지붕의 양옥집으로 변해가며 아바이마을의 모습도 조금씩 변해 왔다. 그렇지만 아바이마을의 현재는 그 세월을 그대로 간직한 듯 길은 여전히 좁고, 붉고 푸른 지붕의 집들은 한 결 같이 낮았다.
‘아바이’란 말은 함경남도와 평안남도 일대에서 아버지나 할아버지를 뜻하는 말이다. 나이든 사람이 많았기에 마을은 ‘아바이, 아바이’하는 소리로 가득했고 그래서 아바이마을로 불리기 시작했다.
그들의 삶은 고단했다. 급히 피난 온 터라 갖은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었다. 그럼에도 그들은 고향 갈 날만을 기다렸다. 남자는 고깃배를 타고 나가 생선을 잡았고, 아낙네들은 돌아온 고깃배 그물에서 생선들을 떼어내며 어려운 시절을 이겨냈다.
그러나 지금의 아바이마을은 텔레비전 드라마와 오락프로 촬영지로 유명세를 타면서 관광지로 변모해 있었다. 실향민들의 참모습은 오징어순대 등의 먹거리나 온갖 유명인이 다녀갔다는 간판 뒤에 가려져 있었다. 하지만 청호동 주민들과 관광객들을 건네주는 나룻배와 함경도의 북녘의 맛과 푸근한 인심을 간직한 아바이순대가 실향민들의 삶을 느끼게 해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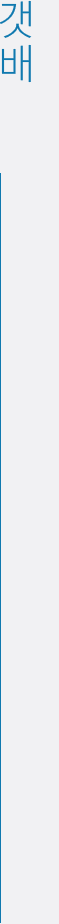
세월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갯배
다시 길을 떠나기 위해 국내 유일의 갯배가 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바닷바람이 실려 있는 주변 전망을 조용히 느껴보았다. 그러는 사이 저 멀리서 또 다른 관광객과 주민들을 태워 바다를 건너는 갯배가 눈에 띄었다. 이상국 시인이 쓴 ‘청호동 갯배’라는 시 한 구절이 떠올랐다.
‘우리는 뱃길 북쪽으로 돌릴 수 없어 / 우리 힘으로는 이 무거운 청호동 끌고 갈 수 없어 / 와이어로프에 복장 꿰인 채 더러운 청초호를 헤맬 뿐 / 가로막은 철조망 넘어 동해에서 / 청진 원산 물이 가자고 / 신포 단천 물이 들어가자고 / 날래 따라나서 라고 날마다 아우성인데 / 우리는 동력도 키도 없어…’
아바이마을은 지형이 섬과 비슷한 곶의 끝부분에 있어 교통이 매우 불편했다. 그래서 청호대교가 생기기 전 중앙동과 청호동을 이어주는 유일한 교통수단은 ‘갯배’였다.
갯배는 철근 줄을 쇠꼬챙이로 당겨 움직이는데 배에 탄 사람이 사공을 도와 속도를 낸다. 출발한다는 기적소리도, 매표소의 시끌벅적한 분위기도 없이 묵묵히 갯배에 오른 사람이라면 누구라고 할 것 없이 갯배를 끈다.
갯배를 운행하는 뱃사공의 깊게 파인 주름이 세월을 증명하듯 자리 잡고 있었고, 갯배의 역사 또한 깊다는 것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다. 잔잔하게 일렁이는 동해바다의 파도 속에 그들이 고향에 두고 온 추억과 그리움이 함께 넘실거리고 있는 것 같았다. 갯배에 몸을 싣고 그리움이 담긴 아바이마을을 시야에 가득히 담아 본다. 그들이 고향에 두고 온 추억들이 애잔하게 멀어지고 있었다.
다시 길을 떠나기 위해 국내 유일의 갯배가 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바닷바람이 실려 있는 주변 전망을 조용히 느껴보았다. 그러는 사이 저 멀리서 또 다른 관광객과 주민들을 태워 바다를 건너는 갯배가 눈에 띄었다. 이상국 시인이 쓴 ‘청호동 갯배’라는 시 한 구절이 떠올랐다.
‘우리는 뱃길 북쪽으로 돌릴 수 없어 / 우리 힘으로는 이 무거운 청호동 끌고 갈 수 없어 / 와이어로프에 복장 꿰인 채 더러운 청초호를 헤맬 뿐 / 가로막은 철조망 넘어 동해에서 / 청진 원산 물이 가자고 / 신포 단천 물이 들어가자고 / 날래 따라나서 라고 날마다 아우성인데 / 우리는 동력도 키도 없어…’
아바이마을은 지형이 섬과 비슷한 곶의 끝부분에 있어 교통이 매우 불편했다. 그래서 청호대교가 생기기 전 중앙동과 청호동을 이어주는 유일한 교통수단은 ‘갯배’였다.
갯배는 철근 줄을 쇠꼬챙이로 당겨 움직이는데 배에 탄 사람이 사공을 도와 속도를 낸다. 출발한다는 기적소리도, 매표소의 시끌벅적한 분위기도 없이 묵묵히 갯배에 오른 사람이라면 누구라고 할 것 없이 갯배를 끈다.
갯배를 운행하는 뱃사공의 깊게 파인 주름이 세월을 증명하듯 자리 잡고 있었고, 갯배의 역사 또한 깊다는 것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다. 잔잔하게 일렁이는 동해바다의 파도 속에 그들이 고향에 두고 온 추억과 그리움이 함께 넘실거리고 있는 것 같았다. 갯배에 몸을 싣고 그리움이 담긴 아바이마을을 시야에 가득히 담아 본다. 그들이 고향에 두고 온 추억들이 애잔하게 멀어지고 있었다.


바다를 품은 호수 청초호
갯배를 타고 몇 분 남짓 지난 후 선착장에 다다랐다. 발걸음은 약속이라도 한 듯 청초호로 향한다. 넓지도, 그렇다고 좁지도 않은 청초호가 시야에 들어왔다. 시가지에서 산과 바다와 호수가 이처럼 아름답게 조망되는 도시가 있을까 싶다.
청초호는 자연현상에 의해 모래가 바다의 일부를 막아서 만들어진 호수이다. 황소가 드러누운 모습으로 바다와 연결되는 청초호는 설악의 맑은 물이 잠시 고였다 흘러 바다로 향하는 마지막 장소라고 한다.
청초호의 조망 포인트는 엑스포타워다. 청초호 주변 공원 내에 위치한 엑스포타워는 높이 73.4m로 아파트 22층의 높이이고, 수직으로 상승하는 역동적 형태는 발전하는 강원도의 미래를 상징하며 청초호 곁에 위용 있게 서있었다. 그 꼭대기에서 바라본 청초호의 잔잔한 물결, 그리고 파도치는 동해바다가 한눈에 가득 담긴다. 영롱하게 빛나는 물빛에 눈이 호화로울 따름이다.
차디찬 회색의 바닷바람이 옷 속을 파고드는 한겨울이었다. 천천히 땅을 밟아가며 오랜 시간 변해 온 풍경 속에 그들이 고향에 두고 온 그리움과 추억을 가득히 느껴본다. 가슴 한켠 삶속에 역사가 공존하는 이곳이 정겨우면서도 낯설게 느껴졌다.
갯배를 타고 몇 분 남짓 지난 후 선착장에 다다랐다. 발걸음은 약속이라도 한 듯 청초호로 향한다. 넓지도, 그렇다고 좁지도 않은 청초호가 시야에 들어왔다. 시가지에서 산과 바다와 호수가 이처럼 아름답게 조망되는 도시가 있을까 싶다.
청초호는 자연현상에 의해 모래가 바다의 일부를 막아서 만들어진 호수이다. 황소가 드러누운 모습으로 바다와 연결되는 청초호는 설악의 맑은 물이 잠시 고였다 흘러 바다로 향하는 마지막 장소라고 한다.
청초호의 조망 포인트는 엑스포타워다. 청초호 주변 공원 내에 위치한 엑스포타워는 높이 73.4m로 아파트 22층의 높이이고, 수직으로 상승하는 역동적 형태는 발전하는 강원도의 미래를 상징하며 청초호 곁에 위용 있게 서있었다. 그 꼭대기에서 바라본 청초호의 잔잔한 물결, 그리고 파도치는 동해바다가 한눈에 가득 담긴다. 영롱하게 빛나는 물빛에 눈이 호화로울 따름이다.
차디찬 회색의 바닷바람이 옷 속을 파고드는 한겨울이었다. 천천히 땅을 밟아가며 오랜 시간 변해 온 풍경 속에 그들이 고향에 두고 온 그리움과 추억을 가득히 느껴본다. 가슴 한켠 삶속에 역사가 공존하는 이곳이 정겨우면서도 낯설게 느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