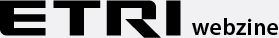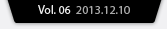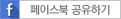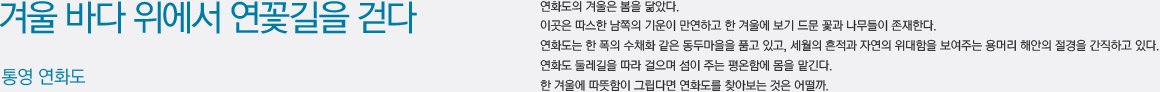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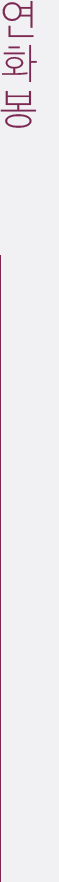
섬의 마루에 오르다
연화도 트레킹을 위해 바다를 건너기로 했다. 여객선이 통영여객터미널에서 연화도까지 항해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50분, 갑판 위에서 겨울 바다 내음을 맡으며 햇빛이 부서지는 바다를 보노라면 그 시간이 그리 길게 느껴지지 않는다. 여객선이 드넓은 바다를 가로질러 가는 동안, 눈에 한가득 바다를 담고 갈매기들과 교감을 나눈다. 그렇게 잠시나마 섬사람이 되기 위한 준비시간을 갖는다. 자연이든 사람이든 ‘만남’은 서로에게 익숙해지기 위한 마음의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드디어 배가 접안을 시작한다. 두 팔을 벌려 환영하는 연화도의 환대를 받으며 섬에 발을 디딘다. 멀리서 볼 때는 작아보이던 연화도였는데 내려서 보니 꽤 크고 넓다는 느낌이 든다. 여객선에서도 적지 않은 인원들이 연화도로 쏟아져 나온다. 연화도에 내리자마자 눈에 띄는 ‘환상의 섬 연화도’라는 표식이 앞으로 있을 트레킹에 기대감을 실어준다.
바다냄새, 해산물, 건어물 냄새가 물씬 어우러진 선착장의 풍경을 지나 본격적으로 연화봉에 오르기 위한 숲길로 접어든다. 이 길에는 한 겨울에도 녹음을 간직한 풍경들, 멋스러운 억새들, 그리고 내려다보이는 파란 바다가 함께하고 있다.
트레킹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연화도에서 가장 지대가 높은 연화봉에 다다른다. 이곳에서 사방으로 연화도의 모습을 내려다 볼 수 있으며 섬을 품고 있는 드넓은 바다를 원 없이 볼 수 있다. 각박한 도시에서는 꿈도 꾸지 못했던 그림이다. 이 순간 자연이 빚어낸 절경을 마주하며 그 기이함에 감탄한다. 바다 저 멀리에서 연화도를 바라볼 때의 모습, 섬 아래에서 연화도를 바라볼 때의 모습, 그리고 섬의 꼭대기 연화봉에서 섬을 바라볼 때의 모습들이 각각 다른 느낌을 준다. 누군가와 ‘소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서로를 바라보는 넒은 안목, 열린 생각일 것이다.
연화도 트레킹을 위해 바다를 건너기로 했다. 여객선이 통영여객터미널에서 연화도까지 항해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50분, 갑판 위에서 겨울 바다 내음을 맡으며 햇빛이 부서지는 바다를 보노라면 그 시간이 그리 길게 느껴지지 않는다. 여객선이 드넓은 바다를 가로질러 가는 동안, 눈에 한가득 바다를 담고 갈매기들과 교감을 나눈다. 그렇게 잠시나마 섬사람이 되기 위한 준비시간을 갖는다. 자연이든 사람이든 ‘만남’은 서로에게 익숙해지기 위한 마음의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드디어 배가 접안을 시작한다. 두 팔을 벌려 환영하는 연화도의 환대를 받으며 섬에 발을 디딘다. 멀리서 볼 때는 작아보이던 연화도였는데 내려서 보니 꽤 크고 넓다는 느낌이 든다. 여객선에서도 적지 않은 인원들이 연화도로 쏟아져 나온다. 연화도에 내리자마자 눈에 띄는 ‘환상의 섬 연화도’라는 표식이 앞으로 있을 트레킹에 기대감을 실어준다.
바다냄새, 해산물, 건어물 냄새가 물씬 어우러진 선착장의 풍경을 지나 본격적으로 연화봉에 오르기 위한 숲길로 접어든다. 이 길에는 한 겨울에도 녹음을 간직한 풍경들, 멋스러운 억새들, 그리고 내려다보이는 파란 바다가 함께하고 있다.
트레킹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연화도에서 가장 지대가 높은 연화봉에 다다른다. 이곳에서 사방으로 연화도의 모습을 내려다 볼 수 있으며 섬을 품고 있는 드넓은 바다를 원 없이 볼 수 있다. 각박한 도시에서는 꿈도 꾸지 못했던 그림이다. 이 순간 자연이 빚어낸 절경을 마주하며 그 기이함에 감탄한다. 바다 저 멀리에서 연화도를 바라볼 때의 모습, 섬 아래에서 연화도를 바라볼 때의 모습, 그리고 섬의 꼭대기 연화봉에서 섬을 바라볼 때의 모습들이 각각 다른 느낌을 준다. 누군가와 ‘소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서로를 바라보는 넒은 안목, 열린 생각일 것이다.


명승의 수도를 느끼다
연화봉에서 가까운 곳에 자리한 연화도인 토굴과 보덕암을 둘러본다. 토굴은 투박하지만 그 안에서 세상의 도를 터득하려고 했던 이들의 모습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 보덕암은 연화사, 해수관음보살, 5층 석탑과 함께 불교의 문화를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암자이다.
연화도는 사명대사가 수도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사명대사는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배척했던 조선 중기에 전국으로 피신을 다니며 수도를 했다. 이런 사명대사를 찾으려고 나선 세 명의 비구니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상봉한 후, 연화도에 와서 수도에 힘을 썼다고 한다. 연화도라는 이름은 사명대사의 전생으로 알려진 한 연화도인이 수도를 하다가 죽음을 맞아 수장을 했는데, 바다에서 연꽃이 피어올랐다는 전설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연화도의 토굴은 그 옛날에 살았던 연화도인, 사명대사, 세 명의 비구니들이 수도했던 곳이다. 그리고 보덕암은 오늘날 ‘수도’와 ‘수행’을 원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맞이하는 곳이다. 깎아내린 듯한 벼랑에 바짝 붙어서 있는 보덕암의 모습은 멀리서 보면 아찔하기도 하지만, 보덕암에서 내려다본 바다는 평온하기만 하다.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 일은 자연 앞에서 자신을 마주할 때 발견하는 솔직함에서 시작하는 것은 아닐까.
연화도를 찾으며 비워놓은 마음이 트레킹을 하며 속속들이 채워지고 있다. 아름다운 바다의 풍광, 그리고 이야기가 숨 쉬는 불교문화를 통해 얻은 깨달음으로 말이다. 겨울 바다 위에 핀 한 떨기 연꽃처럼 아리따운 섬, 연화도가 준 선물이다.
연화봉에서 가까운 곳에 자리한 연화도인 토굴과 보덕암을 둘러본다. 토굴은 투박하지만 그 안에서 세상의 도를 터득하려고 했던 이들의 모습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 보덕암은 연화사, 해수관음보살, 5층 석탑과 함께 불교의 문화를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암자이다.
연화도는 사명대사가 수도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사명대사는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배척했던 조선 중기에 전국으로 피신을 다니며 수도를 했다. 이런 사명대사를 찾으려고 나선 세 명의 비구니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상봉한 후, 연화도에 와서 수도에 힘을 썼다고 한다. 연화도라는 이름은 사명대사의 전생으로 알려진 한 연화도인이 수도를 하다가 죽음을 맞아 수장을 했는데, 바다에서 연꽃이 피어올랐다는 전설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연화도의 토굴은 그 옛날에 살았던 연화도인, 사명대사, 세 명의 비구니들이 수도했던 곳이다. 그리고 보덕암은 오늘날 ‘수도’와 ‘수행’을 원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맞이하는 곳이다. 깎아내린 듯한 벼랑에 바짝 붙어서 있는 보덕암의 모습은 멀리서 보면 아찔하기도 하지만, 보덕암에서 내려다본 바다는 평온하기만 하다.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 일은 자연 앞에서 자신을 마주할 때 발견하는 솔직함에서 시작하는 것은 아닐까.
연화도를 찾으며 비워놓은 마음이 트레킹을 하며 속속들이 채워지고 있다. 아름다운 바다의 풍광, 그리고 이야기가 숨 쉬는 불교문화를 통해 얻은 깨달음으로 말이다. 겨울 바다 위에 핀 한 떨기 연꽃처럼 아리따운 섬, 연화도가 준 선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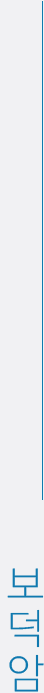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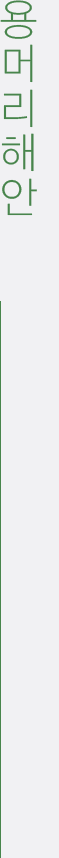
통영8경을 만나다
연화봉과 보덕암에서 바라본 용머리 해안의 모습은 파란 바다 위에 펼쳐 놓은 자연의 걸작과도 같았다. 그 기이함과 아름다움에 탄성이 터져버리는 그 절경은 직접 본 이와 그렇지 않은 이의 경계를 확실하게 구분 짓는다. 연화도를 수식하는 ‘환상의 섬’ 이라는 말은 아마도 용머리 해안의 절경 때문이 아닐까 싶다. 아름다운 용머리해안을 가기 위해 다시 분주히 움직인다.
한 폭의 예쁜 그림처럼 느껴지는 동두마을을 아래로 하고 출렁다리를 지나 용머리 해안에 가까이 다가간다. 다리를 건너니 삼라만상의 모습을 담은 바위의 모습들이 오랜 세월의 그리움을 담고 갤러리처럼 걸려있다. 곧 아슬아슬하게 절벽 끝에 둘러쳐진 나무 울타리를 따라 가며 오르막과 내리막을 반복해 용머리 바위 위를 가로질러 간다.
용머리 바위는 화산암 계열의 암석으로 대자연이 용암으로 거대한 절벽을 반죽해서 구워내고 세월과 파도를 이용해 깎고 다듬어 작품을 만들어 낸 것이다. 연화도의 용머리 바위는 용이 대양을 향해 헤엄쳐가는 형상이다. 용머리 해안에 암초 4개가 연이어 있어서 해서네바위라고도 한다.
눈앞에 놓인 거친 바위들을 손으로 매만진다. 자연의 걸작을 가까이에서 보고 만질 수 있다는 것에 가슴이 벅차오른다. 파도가 용머리 바위에 부딪쳐 웅장하고도 차분한 음악을 들려준다. 태고적 신비를 품은 용머리 바위들은 오랜 세월을 보내며 얼마나 많은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을 품고 있을까. 많은 이들의 이야기를 말없이 들어주는 용머리 바위의 너그러움과 여유로움을 배워간다.
연화봉과 보덕암에서 바라본 용머리 해안의 모습은 파란 바다 위에 펼쳐 놓은 자연의 걸작과도 같았다. 그 기이함과 아름다움에 탄성이 터져버리는 그 절경은 직접 본 이와 그렇지 않은 이의 경계를 확실하게 구분 짓는다. 연화도를 수식하는 ‘환상의 섬’ 이라는 말은 아마도 용머리 해안의 절경 때문이 아닐까 싶다. 아름다운 용머리해안을 가기 위해 다시 분주히 움직인다.
한 폭의 예쁜 그림처럼 느껴지는 동두마을을 아래로 하고 출렁다리를 지나 용머리 해안에 가까이 다가간다. 다리를 건너니 삼라만상의 모습을 담은 바위의 모습들이 오랜 세월의 그리움을 담고 갤러리처럼 걸려있다. 곧 아슬아슬하게 절벽 끝에 둘러쳐진 나무 울타리를 따라 가며 오르막과 내리막을 반복해 용머리 바위 위를 가로질러 간다.
용머리 바위는 화산암 계열의 암석으로 대자연이 용암으로 거대한 절벽을 반죽해서 구워내고 세월과 파도를 이용해 깎고 다듬어 작품을 만들어 낸 것이다. 연화도의 용머리 바위는 용이 대양을 향해 헤엄쳐가는 형상이다. 용머리 해안에 암초 4개가 연이어 있어서 해서네바위라고도 한다.
눈앞에 놓인 거친 바위들을 손으로 매만진다. 자연의 걸작을 가까이에서 보고 만질 수 있다는 것에 가슴이 벅차오른다. 파도가 용머리 바위에 부딪쳐 웅장하고도 차분한 음악을 들려준다. 태고적 신비를 품은 용머리 바위들은 오랜 세월을 보내며 얼마나 많은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을 품고 있을까. 많은 이들의 이야기를 말없이 들어주는 용머리 바위의 너그러움과 여유로움을 배워간다.